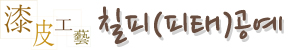칠피공예의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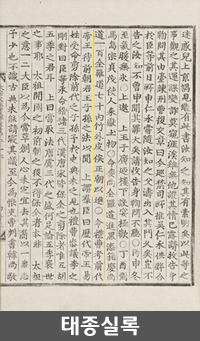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간이 생존하면서부터 의식주 발달과 더불어 활성화 되었다. 인간이 짐승의 가죽을 사용한 흔적은 여기저기서 엿 볼 수 있다.
고분 벽화에 창과 활을 이용하여 사냥하는 그림을 살펴보면 사냥을 하여 얻은 짐승으로부터 고기는 식용으로 사용하고 짐승의 껍질은 인간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곧 가죽 사용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인류가 짐승의 가죽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시기는 구석기시대 전기로 밝혀지고 있다. 물론 이때에는 추위를 극복하기 위한 옷을 만드는데 사용한 것이며 초기의 가죽은 가공하지 않은 생가죽을 그대로 썼을 것이다. 그 뒤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시기는 중기 구석기 시대로 추정된다. 이때 사용한 짐승의 가죽의 종류는 세계 곳곳(80여곳)에 남아있는 구석기시대의 동굴벽화 그림을 통해 추정해보면 말, 순록, 들소, 산양, 곰 등의 가죽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가죽 제품들은 가죽만으로는 물에 약하고 곰팡이가 생겨 쉽게 부패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유물이 극히 드물다. 현존하는 유물은 가죽위에 옻칠을 한 피태칠기(皮胎漆器) 또는 칠피칠기(漆皮漆器)이다.
문헌상의 피태칠기와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신라시대 국왕 직속관부의 내성(內省)에 29개 공방 중 가죽제품 생산을 담당하는 피전(皮典)이 있다. 이것은 공장이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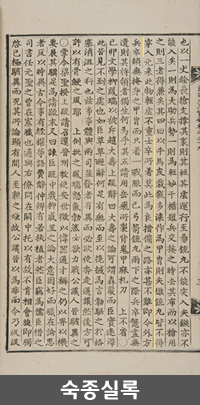
『속일본기(續日本記)』에 천평승보(天平勝寶) 4(752)년 가죽에 나전을 박고 칠을 한 말안장의 거래 애용도 나와 있다. 또 『경국대전(經國大典)』 공전(工典)의 공장(工匠)에는 장인을 담당하는 일에 따라 세분화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가죽(皮)과 관련된 장인은 과피장(裹皮匠) 숙피장(熟皮匠), 사피장(斜皮匠), 주피장(周皮匠), 생피장(生皮匠), 웅피장(熊皮匠), 전피장(捵皮匠)이 기록되어 있다. 가죽의 종류에 따라 다루는 장인을 구분하였으며 가죽을 다루는 기술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과피장(裹皮匠)은 기물에 가죽을 덮어 싸는 일을 하는 장인이고, 숙피장(熟皮匠)은 가죽의 털과 기름을 뽑아 생피(生皮)를 숙피로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장인이고, 사피장(斜皮匠)은 모피(毛皮) 특(特)히 초피(貂皮-담비가죽)를 다루던 장인이고, 주피장(周皮匠)은 갖바치로 가죽신을 만드는 장인이고, 생피장(生皮匠)은 생가죽을 맡아 다루는 장인이고, 웅피장(熊皮匠)은 곰의 가죽을 다루는 일을 맡아 하는 장인이고, 전피장(捵皮匠)은 염소나 양의 털가죽을 다루는 일을 맡아 하던 장인이다.
『太宗實錄』 태종13년 11월 21일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命慶尙、全羅道進黑漆箱。 慶尙道一百, 全羅道七十, 內竹外皮。 俟正朝以進。『太宗實錄』 太宗 13年(1413) 11月 21日(丁酉).
○ 경상도·전라도에 흑칠(黑漆)의 상자(箱子)를 바치라고 명하였다. 경상도는 1백 개이요, 전라도는 70개였는데, 안에는 대나무이고 겉은 가죽이었으며, 정조(正朝)를 기다려서 바치게 하였다.
『肅宗實錄』 숙종21년 7월 18일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以牛馬皮裁截多漆, 作爲甲冑, 則矢鏃銃丸, 皆不得穿入。 元來此物, 輕虛不重, 士卒所着, 莫此爲良, 措備之路, 亦甚不難。 ..... 『肅宗實錄』 肅宗 21年(1695) 7月 18日(戊寅).
○ .... “소와 말 가죽을 재단(裁斷)하여 많은 옻칠[漆]을 하여 갑주(甲胄)를 만든다면 화살촉과 총알이 모두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원래 이 물건은 경허(輕虛)하여 무겁지 않아서 사졸(士卒)의 입는 것이 이것보다도 좋은 것은 없으며, 마련하는 방도가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
위의 기록과 같이 가죽위에 옻칠을 하여 사용하였고 옻칠을 함으로서 질기고 단단함을 이미 알고 있다는 중요한 자료이다.